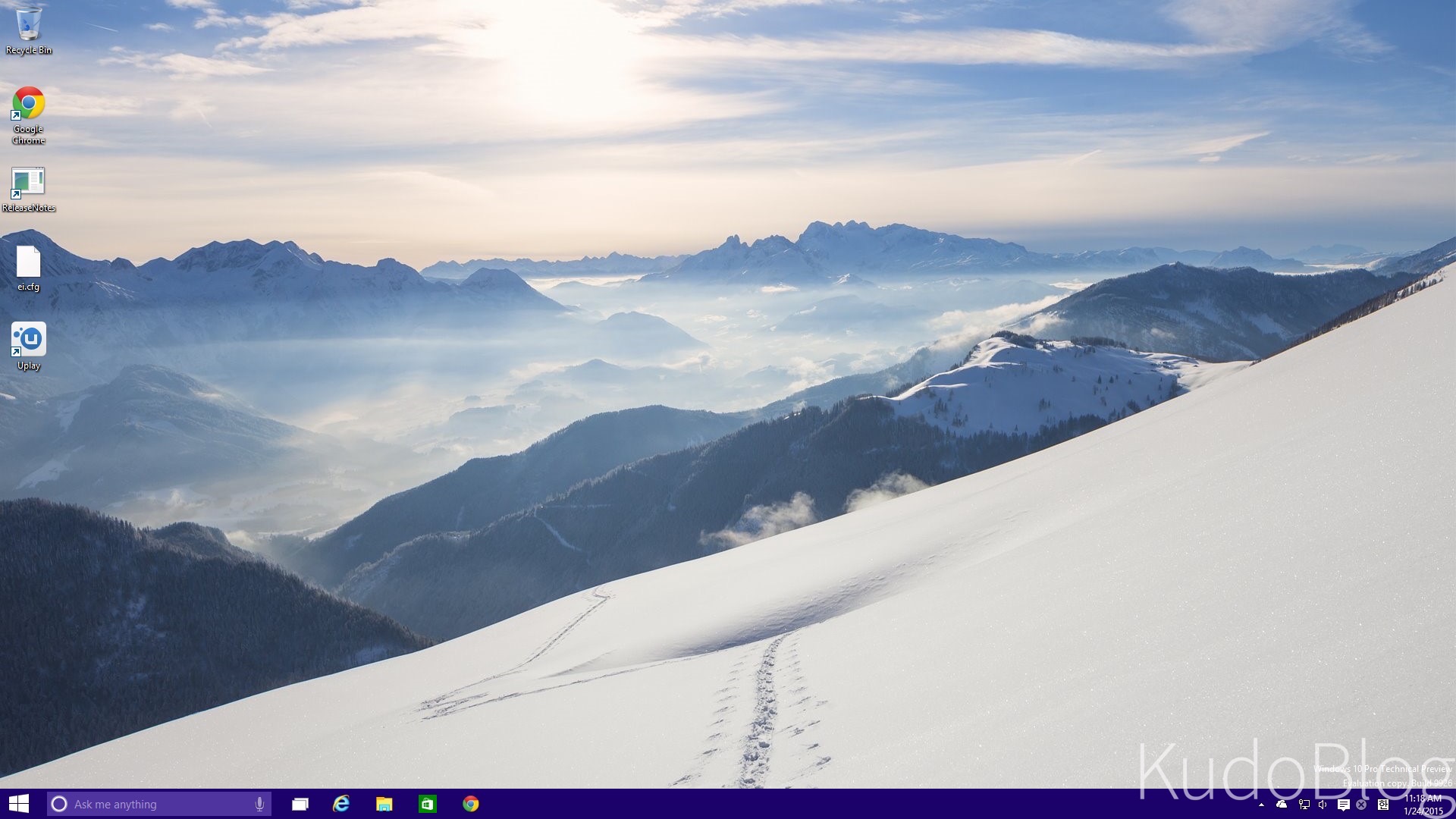“병신같지만 멋있어”의 표본.

제목: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Kingsman: Secret Service
감독: 매튜 본
출연: 콜린 퍼스, 사무엘 L. 잭슨, 마이클 케인, 태론 에거튼
상영 시간: 128분
영화의 스토리가 엉망인 경우는 보통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해 나뉜다. 하나는 그냥 스토리가 엉망인 경우다. 이는 각본의 미흡, 감독의 자질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일부러 스토리를 엉망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경우다. 이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이, 겉면은 개연성이 전혀 없어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영화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들은 모두 완벽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이 후자의 경우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의 플롯은 정말로 각본가가 약을 빨고 쓴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정부를 초월하는 범세계적 사제(?) 첩보기관이라는 설정, 이 첩보기관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삐뚤어졌지만 마법같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주인공, 전세계를 구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걸 하겠다고 정신나간 방법을 쓰는 악역, 주변 캐릭터 모두 현실과 완벽히 동떨어져 있다. 이건 흡사 제작진이 우리에게 시작부터 “앞으로 전할 이야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계속 볼래?”라고 관람동의서(?)를 내미는 느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에 서명하는 순간, 킹스맨의 플롯이 전혀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된다. 그냥 이 미친 파티에 그냥 동석하면 되는 것이다.
이 도박이 성공하는 것은 이 개연성 문제를 지나면 킹스맨의 플롯은 놀랍도록 잘 짜여져있기 때문이다. 적재적소에서 터지는 긴장과 이를 풀어주는 유머, 그리고 현란한 액션 장면이 조화를 잘 이룬다. 그리고 대사 자체도 영화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꼬집는 듯하다. 제임스 본드와 제이슨 본은 물론이고 심지어 잭 바우어까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여기서 문제: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정답은 영화에서 확인하자.) 이러한 당당한 B급 마인드는 이 영화의 원동력이자, 초심이다. 그리고 제작진은 이 초심을 영화 끝까지 잘 유지해낸다.
이러한 각본을 배우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거대로 문제였을테지만, 킹스맨에서 배우들의 아우라 역시 대단하다. 특히 콜린 퍼스는 이미 킹스 스피치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이지만, 킹스맨에서 액션배우로의 변신에 성공했다. 주인공 에그시 역을 맡은 태론 에거튼도 성공적인 캐스팅이었고, 그 뒤를 마이클 케인, 마크 스트롱과 같은 전통적 영국 명품조연들이 잘 받쳐주고 있으니 이 영화가 성공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지도 모르겠다.

영화의 볼거리 또한 살짝 약을 하셨나란 생각이 든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이기 때문에 피가 좀 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머리가 터지는데 거기서 폭죽이 나간다던가)이 뒷통수를 또 갈긴다. 다만 살짝 아쉬운 것은 액션 장면의 카메라워크나 장면 전개는 좋았으나(특히 교회 장면은 어떻게 찍었나 싶을 정도로 인상깊다) 속도가 빠른 느낌인 건 좀 아쉽다.
사실 킹스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냥 최근에 시사회를 갔던 사람들의 후기가 하나같이 “미쳤지만 너무 재밌다”라는 반응이라 점점 궁금증이 쌓여갔다. 그리고 실제로 본 킹스맨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렇다, 정말 미친 영화다. 하지만 킹스맨은 그게 매력이다.
점수: 9.5/10
P.S) 아무래도 악역의 이름인 발렌타인은 노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