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발전과 필요 사이의 딜레마
신기술이라는 것의 시작은 “필요”에 의해서였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들이 만들어졌다. 기록의 편의를 위해 사진이, 이후엔 동영상이, 통신의 편의를 위해 전보와 전화가, 이후엔 휴대전화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다. 언제쯤 이 모멘텀이 사라질까? 언젠가는 기술 개발의 방향성이 없어질 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내 생각엔 지금 이 징후가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진 출처: Apple)
애플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매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카테고리를 재정의하는 데 도가 튼 회사다. 그런데 애플이 이런 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성공을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당장 아이폰-아이패드-애플 워치의 발표 당시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아이폰은 하드웨어에서 결핍된 기능들(3G 등)이 간간이 까였을 뿐이었지만, 아이패드는 그냥 아이폰이 커진 게 아니냐는 정체성적(?) 비아냥이 많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플 워치가 발표되자, 대체 뭐하는 제품인가라는 존재론적(?)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 워치의 개발을 마무리짓고 있는 애플이나 워치용 앱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을 개발자들은 생각이 다를 것이고, 워치는 이러한 의심들을 극복하고 성공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또다른 예를 들어보자. 음성 인식 비서. 사실 음성 인식 기능은 생각보다 오래된 기능이다. 심지어 내가 9년 전에 산 삼성 애니콜 스킨폰에도 음성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 믿으시겠는가? 물론 그 때는 쓸만한 기능이 전혀 아니었다. 또박또박 말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못 알아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음성 인식 기술이 재편된 때가 바로 2011년에 나온 아이폰 4s에 시리가 들어가면서부터다. 시리는 어떻게 보면 음성 인식을 재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때까지 가능할 거라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어 음성 인식이 가능한 데다가, 적당히 받아쳐주기까지 하니까. 정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나오는 토니 스타크의 전자 비서 자비스가 생각나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 뒤로 3년의 시간이 흐르니 미국의 내노라하는 IT 기업 3사가 전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S보이스나 Q보이스는… 에휴) 구글은 구글 나우,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 여기에 애플까지 추가해서 3사 모두 이 기능을 열심히 광고하고 있다. (요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열을 올리는 거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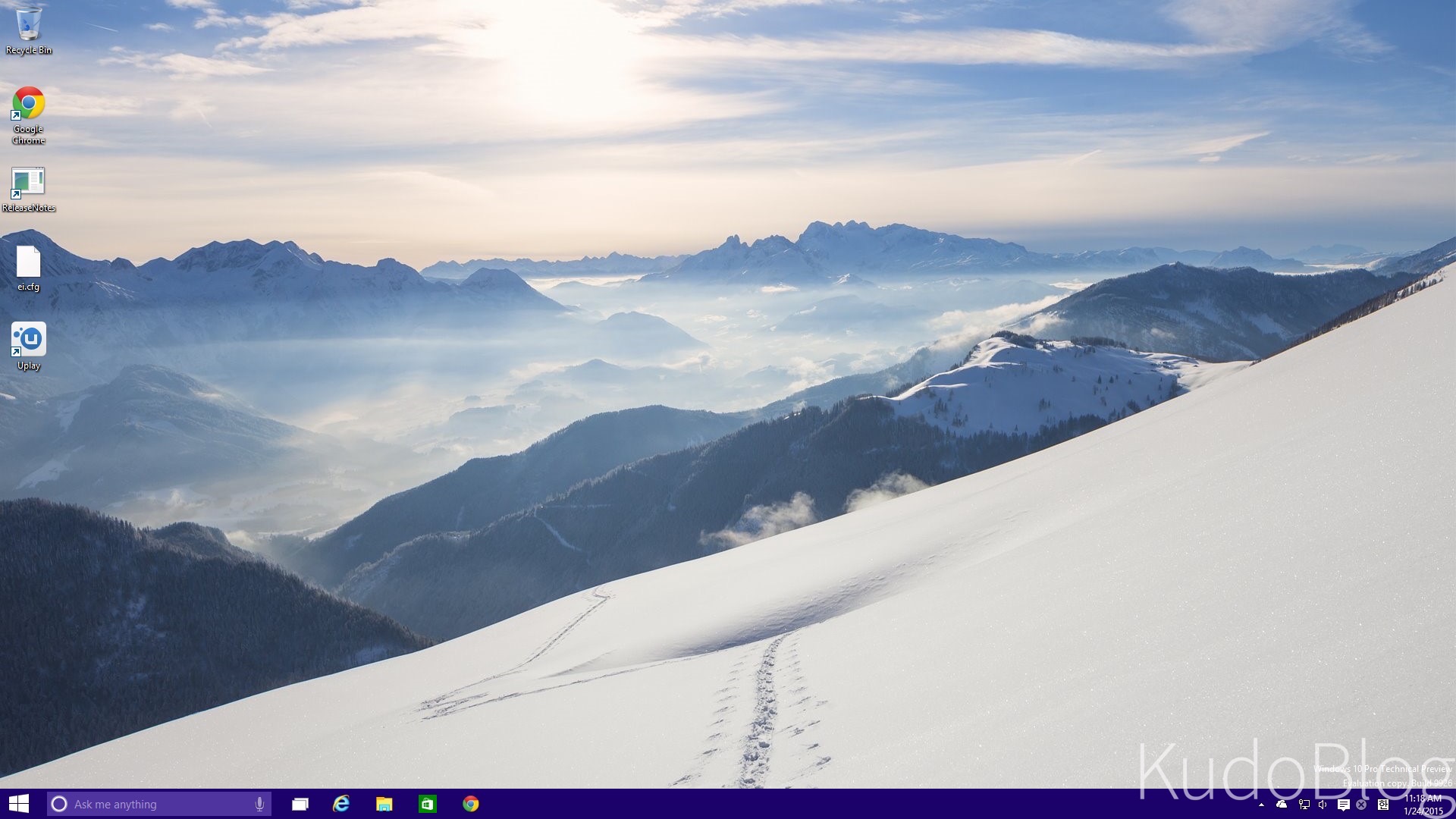
최근에 윈도우 10의 프리뷰 빌드를 테스트하고 있다. 2주 전 이벤트 후 코타나가 탑재된 빌드로 업데이트했다. 몇 가지 지역 설정 문제를 겨우 해결해서 코타나를 활성화한 후, 이런저런 질문을 해본다. 코타나의 기술 자체는 정말 시리보다 훌륭하다. (음성 인식은 좀 많이 뒤지긴 한다만, 그건 시험판이라 그렇다 생각하기로 했다.) 게다가 목소리 기반이 정말로 헤일로 시리즈에서 코타나 성우였던 젠 테일러이기 때문에 정말 마스터 치프가 되어 코타나와 대화하는 기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음성 인식 비서들의 고질적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사용자들에게 이 녀석들이 필요하다고 설득을 못 한다는 것. 나도 솔직히 옆에 늘 시리가 있고, 윈도우에서는 코타나도 있지만 iOS 8에서 애플이 샤잠을 이용한 음악 인식 기능을 추가시켜주기 전까지는 시리를 쓰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샤잠(이나 국내의 유사라 읽고 짝퉁이라 읽습니다 서비스)은 많이 썼기에 그 기능이 추가되니 그때서야 쓸 일이 꽤 많아졌다. (불행히도 코타나는 아직 이런 기능이 없다.) 이들 회사 모두 이 기능들을 홍보는 하지만, 그럴 듯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그냥 열심히 기능들만 홍보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이들도 어떻게 이걸 홍보할 지 모르는 것이다. 이게 홍보가 얼마나 안 되냐면, 내 주변 사람들, 심지어 IT 좀 안다는 사람들까지 모두 내가 시리를 쓰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는 기능이에요… 블랙베리가 아니고서야

위의 예 뿐만 아니라, 솔직히 요즘 들어 뭔가 신기술이 나오면 나 자신도 옛날과 달리 ‘대체 뭐에 쓰는 놈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 때가 많다. 오큘러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당장 5년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적었던 거 같다. 물론 내가 더 어려서였을 수도 있지만, 요즘 나오는 신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이 우연은 아닐 거다.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러한 의구심때문에 개발이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2000년대 들어 비약적인 가속화가 계속 됐고, 이제는 멈출 수도, 한숨을 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이 기술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다”라는 설득을 하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기술의 딜레마랄까.
